3'00" 읽기
- 경비행기를 사용 일본 상공 1km-3km 고도의 대류권에서 총 22개의 에어로졸 샘플 수집
- 대기 미생물 중에서 대장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아, 칸디다 종과 같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원체 확인
- 미생물이 일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중국 북동부의 대규모 농업 지역 유래 가능성 높dk
수많은 미생물이 지구와 지구 표면 근처의 공기 중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분한 물과 좋은 생활 조건을 발견한다. 그러나 더 높은 대기의 공기는 매우 건조하다. 여기에 높은 UV 방사선이 추가된다. 대부분 미생물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강력한 공기 중의 세균이 먼지 폭풍과 함께 대기를 통해 퍼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는 불분명했다.
일본 상공의 공기 샘플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로니아 연구 및 고등 연구 연구소(ICREA)의 Xavier Rodó가 이끄는 팀은 이제 얼마나 많은 미생물 생존자가 대기의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조사했다. 생물학자들은 소위 행성경계층(PBL) 바로 위의 대기풍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했다. 이는 표면 근처의 지구 대기 중 1.5~2km 위로 뻗어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Rodó와 그의 팀은 경비행기를 사용하여 일본 상공 1,000~3,000m 고도의 대류권에서 총 22개의 에어로졸 샘플을 수집하고 이를 같은 날 지상 가까이에서 수집한 에어로졸 샘플과 비교했다. 생물학자들은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미생물을 식별했다. 공기 시료에 포함된 미생물도 실험실에서 배양했다.
놀라운 미생물 다양성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이 공기와 함께 대기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ó와 그의 동료들은 DNA를 사용해 266종의 곰팡이와 305종의 박테리아를 포함 매우 다양한 미생물을 식별했다. 이들 “공중 표류자”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게 무해한 종이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또한 대기 미생물 중에서 대장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아, 칸디다 종과 같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원체를 확인했다.
연구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들 미생물 중 일부는 대기 중에 존재한 후에도 여전히 생존이 가능했으며, 여기에는 유전자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여러 다제 내성 균주가 포함되었다.
수천 킬로미터 이상 운송됨
에어로졸 샘플의 미네랄 구성과 샘플 채취 전과 도중의 기상 조건을 토대로 생물학자들은 에어로졸에 포함된 기단과 미생물이 일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중국 북동부의 대규모 농업 지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미생물은 공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결과는 하수, 살충제 및 비료 폐기물이 풍부한 에어로졸이 기류와 함께 대기로 유입돼 다양한 병원체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장거리로 퍼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Rodó와 그의 동료들은 보고했다. “이것은 생존 가능한 인간 병원체와 내성 유전자를 먼 지리적 위치에 분산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북극과 같은 먼 곳에서도 다제내성 세균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세균성 병원체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첫 번째 증거
바이러스는 이미 대기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미생물 병원체에 대해 이렇게 긴 여정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가라앉은 후에도 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여전히 감염시킬 수 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과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팀은 썼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24; doi: 10.1073/pnas.2404191121)
출처: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 경비행기를 사용 일본 상공 1km-3km 고도의 대류권에서 총 22개의 에어로졸 샘플 수집
- 대기 미생물 중에서 대장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아, 칸디다 종과 같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원체 확인
- 미생물이 일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중국 북동부의 대규모 농업 지역 유래 가능성 높dk
박테리아는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한다.
병원체가 대기를 통해 퍼지는 방법
항공 여행:
일부 인간 병원체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지구 대기의 기류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행의 적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미생물은 여전히 생존 가능하며 땅에 가라앉은 후에도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일부 병원체는 항생제에도 내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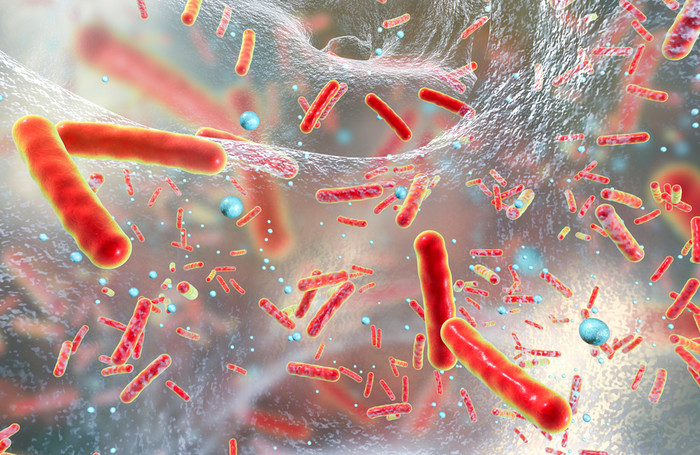 |
| ▲ 미생물은 대기 중의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가 다시 땅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 Dr Microbe / GettyImages |
수많은 미생물이 지구와 지구 표면 근처의 공기 중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분한 물과 좋은 생활 조건을 발견한다. 그러나 더 높은 대기의 공기는 매우 건조하다. 여기에 높은 UV 방사선이 추가된다. 대부분 미생물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강력한 공기 중의 세균이 먼지 폭풍과 함께 대기를 통해 퍼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는 불분명했다.
일본 상공의 공기 샘플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로니아 연구 및 고등 연구 연구소(ICREA)의 Xavier Rodó가 이끄는 팀은 이제 얼마나 많은 미생물 생존자가 대기의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조사했다. 생물학자들은 소위 행성경계층(PBL) 바로 위의 대기풍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했다. 이는 표면 근처의 지구 대기 중 1.5~2km 위로 뻗어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Rodó와 그의 팀은 경비행기를 사용하여 일본 상공 1,000~3,000m 고도의 대류권에서 총 22개의 에어로졸 샘플을 수집하고 이를 같은 날 지상 가까이에서 수집한 에어로졸 샘플과 비교했다. 생물학자들은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미생물을 식별했다. 공기 시료에 포함된 미생물도 실험실에서 배양했다.
놀라운 미생물 다양성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이 공기와 함께 대기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ó와 그의 동료들은 DNA를 사용해 266종의 곰팡이와 305종의 박테리아를 포함 매우 다양한 미생물을 식별했다. 이들 “공중 표류자”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게 무해한 종이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또한 대기 미생물 중에서 대장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아, 칸디다 종과 같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원체를 확인했다.
연구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들 미생물 중 일부는 대기 중에 존재한 후에도 여전히 생존이 가능했으며, 여기에는 유전자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여러 다제 내성 균주가 포함되었다.
수천 킬로미터 이상 운송됨
에어로졸 샘플의 미네랄 구성과 샘플 채취 전과 도중의 기상 조건을 토대로 생물학자들은 에어로졸에 포함된 기단과 미생물이 일본에서 약 2,000km 떨어진 중국 북동부의 대규모 농업 지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미생물은 공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결과는 하수, 살충제 및 비료 폐기물이 풍부한 에어로졸이 기류와 함께 대기로 유입돼 다양한 병원체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장거리로 퍼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Rodó와 그의 동료들은 보고했다. “이것은 생존 가능한 인간 병원체와 내성 유전자를 먼 지리적 위치에 분산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북극과 같은 먼 곳에서도 다제내성 세균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세균성 병원체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첫 번째 증거
바이러스는 이미 대기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미생물 병원체에 대해 이렇게 긴 여정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가라앉은 후에도 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여전히 감염시킬 수 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과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팀은 썼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24; doi: 10.1073/pnas.2404191121)
출처: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더사이언스플러스=문광주 기자]
[저작권자ⓒ the SCIENCE plu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Basic Science
+
AI & Tech
+
Photo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