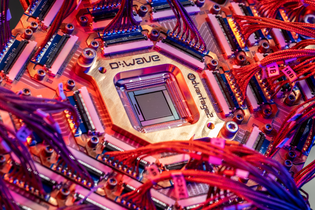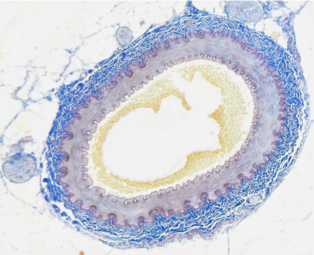4분 읽기
갇힌 반딧불이를 몇 시간 동안 살아있게 둔다. 이렇게 하면 빛나는 먹이의 다른 개체들도 빛에 끌려 거미줄에 들어가게 된다.
반딧불이는 몸에서 빛을 내는 분자를 생성한다. 이러한 생체 발광은 딱정벌레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유인하여 짝짓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반딧불이는 프세크루스 클라비스 거미의 깔때기 모양 거미줄에 갇혀 죽을 때까지도 이러한 발광을 계속한다. 반딧불이는 이 아열대 거미의 함정에 빠진 후에도 최대 한 시간 동안 계속 빛을 낸다.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일까?
놀라운 점은 Psechridae(2개 속에 약 70종이 있는 거미목 거미과의 한 종류)에 속하는 이 야행성 동물들이 반딧불이를 잡은 후, 곧바로 먹지 않고 반복적으로 빛나는 먹이를 찾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 포식성 거미류가 반딧불이를 미끼로 삼아, 빛 신호를 이용해 더 많은 곤충을 유인하고 더 많은 먹이를 잡는 것일까?
대만 퉁하이대학교의 호 인입(Ho Yin Yip)이 이끄는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조사했다. 생물학자들은 먼저 대만의 숲에서 거미 종인 Psechrus clavis의 거미줄을 찾았다. 그런 다음 이 거미줄 22개에 LED를 설치했는데, 이 거미줄들은 대만 토종인 Diaphanes lampyroides의 반딧불이와 비슷한 강도와 파장으로 빛났다. 연구진은 나머지 28개의 거미줄은 비워두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두었다. 그런 다음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거미줄을 만든 거미와 먹이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촬영했다.
발광 미끼, 거미 먹이 증가
영상 녹화 결과, LED가 없는 거미줄보다 조명이 있는 거미줄에 평균 세 배 더 많은 곤충이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명이 주로 수컷 반딧불이를 유인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미줄보다 조명이 있는 거미줄로 날아드는 수컷 반딧불이의 수가 최대 10배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수컷 반딧불이는 땅바닥에 있는 그물의 움직이지 않는 LED 신호를 암컷 반딧불이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딧불이는 평생 유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날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땅바닥에만 서식한다.
거미는 포획한 먹이에 다르게 반응했다. 나방이나 나비가 거미줄에 들어오면 거미는 즉시 잡아먹었다. 그러나 거미줄에 유인되어 포획된 반딧불이는 살아남아 최대 한 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이다.
거미는 반딧불이 신호의 혜택을 누린다
생물학자들은 거미가 빛나는 먹이를 의도적으로 미끼로 사용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를 살려두면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빛은 거미의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반면, 빛을 내지 않는 먹이 곤충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아 즉시 먹힌다.
동해대학교의 선임 저자인 이민 초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성적 의사소통을 위한 반딧불이 신호가 거미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먹이로 사용할 곤충이 전반적으로 적은 겨울철에 거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반딧불이(Diaphanes lampyroides)도 겨울에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다른 포식자 종들도 빛이 먹이를 유인한다는 사실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예를 들어, 어두운 심해에 사는 아귀는 입 앞에서 일종의 등불을 흔들어 먹이를 유인한다. 이는 아귀가 직접 사냥할 필요 없이 먹이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사냥 전략을 가진 다른 포식성 어류와 달리, 아귀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대신 "랜턴" 속 박테리아가 빛을 내도록 한다.
거미는 또한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신 반딧불이의 생물 발광에 기생한다. 거미줄의 실크 실도 달빛을 반사하고 먹이를 유인하지만, 입과 그의 팀이 설명하듯이 그 안에 갇힌 반딧불이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포식성 거미는 일종의 아웃소싱, 즉 몸에서 빛을 내는 것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가 왜 단순히 빛나기를 멈추지 않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빛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는 거미를 겁주어 쫓아내고 죽음을 피하려는 헛된 시도일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거미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독소가 반딧불이의 빛나기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참고: Journal of Animal Ecology, 2025; doi: 10.1111/1365-2656.70102
출처: British Ecological Society
갇힌 반딧불이를 몇 시간 동안 살아있게 둔다. 이렇게 하면 빛나는 먹이의 다른 개체들도 빛에 끌려 거미줄에 들어가게 된다.
거미, 반딧불이를 미끼로 사용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 더 많은 먹이를 유인
교묘한 함정:
생물학자들은 야행성 거미인 프세크루스 클라비스(Psechrus clavis)가 반딧불이를 살아있는 미끼로 사용하여 더 많은 먹이를 거미줄로 유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미는 빛나는 벌레를 거미줄에 잡아먹지만 바로 먹지는 않는다. 대신, 갇힌 반딧불이를 몇 시간 동안 살아있게 둔다. 이렇게 하면 빛나는 먹이의 다른 개체들도 빛에 끌려 거미줄에 들어가게 된다.
 |
| ▲ 거미(Psechrus clavis). © Tunghai University Spider Lab |
반딧불이는 몸에서 빛을 내는 분자를 생성한다. 이러한 생체 발광은 딱정벌레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유인하여 짝짓기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반딧불이는 프세크루스 클라비스 거미의 깔때기 모양 거미줄에 갇혀 죽을 때까지도 이러한 발광을 계속한다. 반딧불이는 이 아열대 거미의 함정에 빠진 후에도 최대 한 시간 동안 계속 빛을 낸다.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일까?
놀라운 점은 Psechridae(2개 속에 약 70종이 있는 거미목 거미과의 한 종류)에 속하는 이 야행성 동물들이 반딧불이를 잡은 후, 곧바로 먹지 않고 반복적으로 빛나는 먹이를 찾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 포식성 거미류가 반딧불이를 미끼로 삼아, 빛 신호를 이용해 더 많은 곤충을 유인하고 더 많은 먹이를 잡는 것일까?
대만 퉁하이대학교의 호 인입(Ho Yin Yip)이 이끄는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조사했다. 생물학자들은 먼저 대만의 숲에서 거미 종인 Psechrus clavis의 거미줄을 찾았다. 그런 다음 이 거미줄 22개에 LED를 설치했는데, 이 거미줄들은 대만 토종인 Diaphanes lampyroides의 반딧불이와 비슷한 강도와 파장으로 빛났다. 연구진은 나머지 28개의 거미줄은 비워두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두었다. 그런 다음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거미줄을 만든 거미와 먹이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촬영했다.
 |
| ▲ 거미줄에 갇힌 거미와 반딧불이. © Tunghai University Spider Lab |
발광 미끼, 거미 먹이 증가
영상 녹화 결과, LED가 없는 거미줄보다 조명이 있는 거미줄에 평균 세 배 더 많은 곤충이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명이 주로 수컷 반딧불이를 유인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미줄보다 조명이 있는 거미줄로 날아드는 수컷 반딧불이의 수가 최대 10배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
수컷 반딧불이는 땅바닥에 있는 그물의 움직이지 않는 LED 신호를 암컷 반딧불이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딧불이는 평생 유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날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땅바닥에만 서식한다.
거미는 포획한 먹이에 다르게 반응했다. 나방이나 나비가 거미줄에 들어오면 거미는 즉시 잡아먹었다. 그러나 거미줄에 유인되어 포획된 반딧불이는 살아남아 최대 한 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이다.
 |
| ▲ 밤에 빛나는 암컷 거대 반딧불이(Lampyris noctiluca). |
거미는 반딧불이 신호의 혜택을 누린다
생물학자들은 거미가 빛나는 먹이를 의도적으로 미끼로 사용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를 살려두면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빛은 거미의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반면, 빛을 내지 않는 먹이 곤충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아 즉시 먹힌다.
동해대학교의 선임 저자인 이민 초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성적 의사소통을 위한 반딧불이 신호가 거미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먹이로 사용할 곤충이 전반적으로 적은 겨울철에 거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반딧불이(Diaphanes lampyroides)도 겨울에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다른 포식자 종들도 빛이 먹이를 유인한다는 사실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예를 들어, 어두운 심해에 사는 아귀는 입 앞에서 일종의 등불을 흔들어 먹이를 유인한다. 이는 아귀가 직접 사냥할 필요 없이 먹이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사냥 전략을 가진 다른 포식성 어류와 달리, 아귀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대신 "랜턴" 속 박테리아가 빛을 내도록 한다.
 |
| ▲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들. © Tunghai University Spider Lab |
거미는 또한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신 반딧불이의 생물 발광에 기생한다. 거미줄의 실크 실도 달빛을 반사하고 먹이를 유인하지만, 입과 그의 팀이 설명하듯이 그 안에 갇힌 반딧불이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포식성 거미는 일종의 아웃소싱, 즉 몸에서 빛을 내는 것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거미줄에 갇힌 반딧불이가 왜 단순히 빛나기를 멈추지 않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빛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는 거미를 겁주어 쫓아내고 죽음을 피하려는 헛된 시도일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거미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독소가 반딧불이의 빛나기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참고: Journal of Animal Ecology, 2025; doi: 10.1111/1365-2656.70102
출처: British Ecological Society
[더사이언스플러스=문광주 기자]
[저작권자ⓒ the SCIENCE plu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Basic Science
+
AI & Tech
+
Phot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