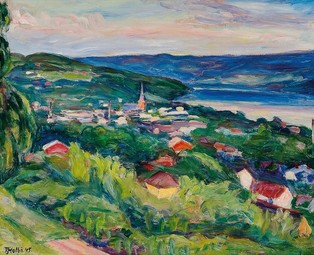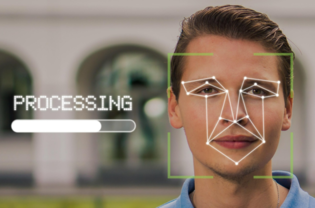3'10" 읽기
- 중성자별은 무거운 별이 수명 주기가 끝날 때, 초신성에서 폭발시 형성
- 별의 가느다란 잔해의 무게는 약 0.77 태양질량에 불과, 중성자별의 무게는 평소의 1/2
- 중성자별 내부의 밀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 원자도 붕괴되고 중성자만 남게 돼
-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워 미스테리
중성자별은 무거운 별이 수명 주기가 끝날 때, 초신성에서 폭발시 형성된다. 남아 있는 것은 크기가 20~30km에 불과하지만 좋은 두 태양의 질량을 결합할 수 있는 별의 핵이다. 중성자별 내부의 밀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 원자도 붕괴되고 중성자만 남게 된다. 그 결과, 핵에서 이질적인 초유체 상태의 물질이 형성된다.
"비정상적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중성자 별의 관찰은 중심 밀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고 튀빙겐 대학의 빅토르 도로센코(Victor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이 설명했다. 그러한 극단은 그러한 별 잔해의 내부 작동에 대한 공통 모델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지 투성이 껍질에 빛나는 유물
Doroshenko와 그의 팀이 이제 더 자세히 조사한 중성자별은 더욱 흥미진진하다. 조밀한 항성 잔해는 초신성 잔해의 빛나는 먼지와 가스 외피에 있으며 몇 년 전 감마선 관측소 H.E.S.S.를 사용하여 발견되었다. 나미비아에서 발견. 이후에 X선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HESS J1731-347이 냉각되는 중성자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성자별의 크기와 무게는 처음에는 불분명했다. 바로 작년에, 천문학자들은 유럽의 가이아 위성의 도움으로 같은 초신성 엔벨로프(Envelop)에 있는 HESS J1731-347의 파트너 별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물체에 대한 모든 관측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를 사용해 중성자별의 질량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전의 부정확성을 수정하고 모델을 개선할 수 있었다. 중성자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공동 저자인 Valery Suleimanov가 설명했다.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움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반지름이 10.4km에 불과한 중성자별 HESS J1731-347은 동급의 비교적 가느다란 대표다. 훨씬 더 특이한 것은 질량이 0.77 태양 질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 둥지의 무게는 일반적인 중성자별 무게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질량 추정치는 HESS J1731-347을 지금까지 알려진 중성자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사실 중성자별은 너무 가벼워서 기존의 설명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 전구 별이 얼마나 무겁고 코어 붕괴와 후속 폭발 동안 손실되는 질량은 실제로 천체 물리학 법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태양 질량이 1.17 미만인 중성자 별의 형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에 알려진 가장 가벼운 표본은 1.174 태양 질량으로 거의 정확히 이 한계에 있었다.
쿼크별인가?
그러나 이것은 HESS J1731-347과 다르다. 낮은 질량이 확인되면 0.77 태양 질량으로 이론적인 한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은 "그러한 가벼운 중성자 별은 따라서 천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물체다"고 말한다. "이론적 한계의 확인된 위반은 중성자 별 형성과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별의 잔해가 정상적인 중성자별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HESS J1731-347이 쿼크 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상의 물체는 중성자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중성자까지도 붕괴된다. 그런 물체의 중심에는 빅뱅 직후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쿼크-글루온 수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유망한 쿼크 별 후보다"고 공동 저자인 Andrea Santangelo가 말했다.
여전히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HESS J1731-347의 중심에 있는 물체가 "정상적인" 중성자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특히 흥미로운 물체다. "그것을 통해 중성자 별의 질량-반경 평면에서 매개변수 공간의 아직 탐험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할 수 있다"고 Santangelo는 말했다. "이것은 밀도 물질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는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Nature Astronomy, 2022; doi: 10.1038/s41550-022-01800-1)
출처: Nature Astr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 중성자별은 무거운 별이 수명 주기가 끝날 때, 초신성에서 폭발시 형성
- 별의 가느다란 잔해의 무게는 약 0.77 태양질량에 불과, 중성자별의 무게는 평소의 1/2
- 중성자별 내부의 밀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 원자도 붕괴되고 중성자만 남게 돼
-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워 미스테리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중성자별에 관한 수수께끼
비정상저으로 가벼운 별 잔해는 현재 그림에 맞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빛: 천체 물리학자들은 초신성 잔해에서 지금까지 가장 가벼운 중성자별을 발견했다. 별의 가느다란 잔해의 무게는 약 0.77 태양질량에 불과하므로 중성자별의 무게는 평소의 1/2이다. 이것은 이 가벼움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연구원들이 "Nature Astronomy"에 보고한 것처럼 낮은 질량은 물질의 이국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 초신성 잔해 HESS J1731-347(왼쪽)과 XMM-Newton 및 Suzaku 망원경의 고해상도 X선 스펙트럼의 잘못된 컬러 이미지. © 튀빙겐 대학교 |
중성자별은 무거운 별이 수명 주기가 끝날 때, 초신성에서 폭발시 형성된다. 남아 있는 것은 크기가 20~30km에 불과하지만 좋은 두 태양의 질량을 결합할 수 있는 별의 핵이다. 중성자별 내부의 밀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 원자도 붕괴되고 중성자만 남게 된다. 그 결과, 핵에서 이질적인 초유체 상태의 물질이 형성된다.
"비정상적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중성자 별의 관찰은 중심 밀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고 튀빙겐 대학의 빅토르 도로센코(Victor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이 설명했다. 그러한 극단은 그러한 별 잔해의 내부 작동에 대한 공통 모델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지 투성이 껍질에 빛나는 유물
Doroshenko와 그의 팀이 이제 더 자세히 조사한 중성자별은 더욱 흥미진진하다. 조밀한 항성 잔해는 초신성 잔해의 빛나는 먼지와 가스 외피에 있으며 몇 년 전 감마선 관측소 H.E.S.S.를 사용하여 발견되었다. 나미비아에서 발견. 이후에 X선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HESS J1731-347이 냉각되는 중성자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중성자별의 크기와 무게는 처음에는 불분명했다. 바로 작년에, 천문학자들은 유럽의 가이아 위성의 도움으로 같은 초신성 엔벨로프(Envelop)에 있는 HESS J1731-347의 파트너 별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물체에 대한 모든 관측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를 사용해 중성자별의 질량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전의 부정확성을 수정하고 모델을 개선할 수 있었다. 중성자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공동 저자인 Valery Suleimanov가 설명했다.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가벼움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반지름이 10.4km에 불과한 중성자별 HESS J1731-347은 동급의 비교적 가느다란 대표다. 훨씬 더 특이한 것은 질량이 0.77 태양 질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 둥지의 무게는 일반적인 중성자별 무게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질량 추정치는 HESS J1731-347을 지금까지 알려진 중성자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사실 중성자별은 너무 가벼워서 기존의 설명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 전구 별이 얼마나 무겁고 코어 붕괴와 후속 폭발 동안 손실되는 질량은 실제로 천체 물리학 법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태양 질량이 1.17 미만인 중성자 별의 형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에 알려진 가장 가벼운 표본은 1.174 태양 질량으로 거의 정확히 이 한계에 있었다.
쿼크별인가?
그러나 이것은 HESS J1731-347과 다르다. 낮은 질량이 확인되면 0.77 태양 질량으로 이론적인 한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Doroshenko와 그의 동료들은 "그러한 가벼운 중성자 별은 따라서 천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물체다"고 말한다. "이론적 한계의 확인된 위반은 중성자 별 형성과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별의 잔해가 정상적인 중성자별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HESS J1731-347이 쿼크 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상의 물체는 중성자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중성자까지도 붕괴된다. 그런 물체의 중심에는 빅뱅 직후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쿼크-글루온 수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유망한 쿼크 별 후보다"고 공동 저자인 Andrea Santangelo가 말했다.
여전히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HESS J1731-347의 중심에 있는 물체가 "정상적인" 중성자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특히 흥미로운 물체다. "그것을 통해 중성자 별의 질량-반경 평면에서 매개변수 공간의 아직 탐험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할 수 있다"고 Santangelo는 말했다. "이것은 밀도 물질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는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Nature Astronomy, 2022; doi: 10.1038/s41550-022-01800-1)
출처: Nature Astr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더사이언스플러스=문광주 기자]
[저작권자ⓒ the SCIENCE plu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Basic Science
+
AI & Tech
+
Photos
+